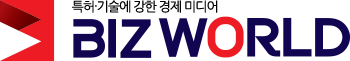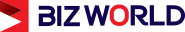약가 인하 등 1기 행정부 기조 2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
시밀러 활성화와 중국 견제 지속, FDA 규제 완화 가능성도

[비즈월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식이 오늘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정식 취임 이후에야 헬스케어 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가 인하 등 1기 행정부 때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역할을 했던 '아젠다 47'를 살펴보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부분으로는 ▲필수 의약품 원부자재 수입 제한·자국 생산 강화 ▲바이오 보안 강조(생물보안법 추진)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활성화를 통한 약가 인하 등이 담겨 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제약·바이오산업에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는 분석이 있다. 하나는 미국 약가가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대형 제약회사(Big Pharma)가 미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대형 제약회사가 다른 국가에는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이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당시 제약사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미국 메디케어에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13948)을 내리는 등 다소 강제적인 방식을 바탕으로 약가를 인하하려고 한 바 있다.
약가 인하 관련 정책은 의료비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치료 효능이 동등한 수준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 기조로 약가 인하, 자국 내 필수의약품 생산, 공적부조·사회보험 개혁 등을 언급했다. 또 과거 미국산 원부자재의 국외 유출을 저지하는 등 1기 정부에서 강조했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견제 기조 역시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는 지난해까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중심으로 견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 전망됐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등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 당하고,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미국 118대 의회 하원은 이를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가 중국산 바이오기술 장비와 서비스 조달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다만 최종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119대에서 비슷한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국내 CDMO 기업들의 수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허가 과정이 간소화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FDA 규제 완화로 혁신 신약 승인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번 2기 때도 혁신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은 1기 행정부 말의 주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약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강화돼 해당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욱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한국 CDMO 기업의 역할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와 함께 미국 내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의무 역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더불어 관세 인상과 같은 요인 역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