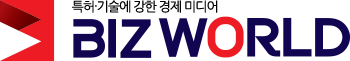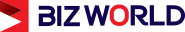50대 이후 소실되는 골량으로 골다공증 위험 높아져
꾸준힌 치료와 'P1NP' 혈액검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비즈월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이번 추석 연휴 그동안 뵙기 어려웠던 부모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오랜 만에 만나는 만큼 부모님 건강을 챙기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중 5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뼈 건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50대에 들어서면 골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 소실이 진행된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겪으면서 더욱 빠르게 골 소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골 소실은 흔히 '골다공증'을 야기한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이다. 뼈의 양 감소와 질적인 변화가 원인이며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그러나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모든 부위에서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자주 나타난다. 심한 경우 재채기를 하거나 가구에 부딪히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특히 골절은 한번의 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 환자의 72%, 고관절 골절 환자의 59%는 골절 발생 후 5년 이내에 재골절을 경험한다.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 약 6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망한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질환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골다공증 환자 중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약 3명에 불과하다. 치료를 받는 인원의 약 67%도 1년 이내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다공증의 치료제는 경구 복용제와 주사제가 있다. 경구 복용의 경우 주 1회 혹은 월 1회 복용 후 30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복용법이 까다롭고 위장이 안 좋은 환자에게는 처방이 쉽지 않다.
주사제는 투약 시마다 병원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매일 주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크다. 주사 후 근육통,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들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부모님의 골다공증 치료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을 앓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님의 골다공증 검사 결과와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치료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골다공증 혈액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골다공증 검사로는 'P1NP(total procollagen type 1 amino-terminal propeptide)'와 'CTX(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가 있다. 우리 몸속의 뼈는 평생 동안 형성과 흡수를 반복하며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뼈로 모두 교체되는데 P1NP는 뼈 형성, CTX는 뼈 흡수와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다. 해당 수치를 측정하면 골다공증 치료 반응을 알 수 있다.
즉 이 검사를 활용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치료 경과를 단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의 순응도까지 판단할 수 있어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검사 모두 혈액 검사라 비교적 간단하며 연 3회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동옥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교수는 "평소 부모님 뼈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은 현재 부모님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골다공증인 경우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추석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고 눈·비 등으로 낙상할 수 있어 검사와 치료를 통해 미리 뼈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